부처님 품 안에서
부루나존자의 길을 걷고파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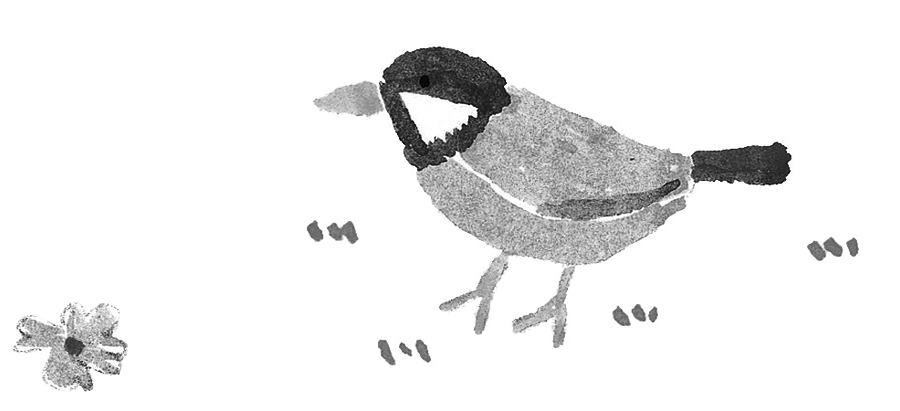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의미는 삶의 척도를 바꾸는 일대사
언젠가 한 신문에 썼던 구절이 있다. “무지에서 눈을 뜨고 알아가는 과정은 짐짓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라는 의미는 삶의 척도를 바꾸는 일대사가 된다”라는 표현이었다.
그렇다. 내가 꼭 그 짝이다. 일반 언론에서 수습을 뗄 무렵 떨어진 인터뷰 지시는 다름 아닌 모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다. 당시에는 흔치 않던 불교 언론사를 운영하던 스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대표 주자 격이었다. 신문의 양면으로 소개된 스님의 기사는 단박에 언론을 탔고 취재원이던 스님 역시 아주 만족해하는 모습이었다.
스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이 운영하는 신문사로 이직을 해 올 것을 제안했다. 소위 말해, 스카우트 제의였다. 부모님과의 의논은 통과의례였고 난 모태신앙을 갖고 자란 사람답게 불교신문사로의 이직을 결정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때의 생생한 꿈은 마치 정해져 있는 길을 따라 찾아가는 양, 현실로 나타났다. 넓디넓은 계곡 가운데 성큼성큼 놓인 커다란 바위를 건너가니, 스님은 중간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시간이 흘러 돌이켜 보니 내가 건넌 계곡은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의 건넘이었고, ‘차안(此岸)에서 피안(彼岸)으로’의 건넘으로 느껴졌다. 그렇듯 내 서른 살의 출발은 온전한 곳으로의 진일보였다.
불교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며 물 만난 물고기처럼
애써 외우려 하지 않았음에도 절로 외워진 『반야심경』과 기본적인 의식가 등은 마치 한생을 살았던가 싶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습득이 빨랐고 어렵다는 불교 용어는 들으면 바로 이해가 갈 정도로 익숙한 단어로 다가왔다. 그뿐인가. 휴일을 알지 못할 정도로 현장을 누비던 기자 생활은 이전의 업무보다 훨씬 흥미로웠고 수승한 스님들과의 대담에서는 모골이 송연해지는 감동으로 몇 날을 작은 흥분 속에서 살아야 했다.
기사를 쓰고 신문을 만드는 일에서도 난 차 순위를 마다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그랬으니 매주 신문이 마감되는 날이면 새벽을 밝히며 일을 했고 불교 안에서의 작은 보폭은 조금씩 그 폭을 넓혀나가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전국으로 동선도 자연 넓어지고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야산 어른 스님의 입적 소식과 세상에 글로 반향을 일으켰던 조계산 어른 스님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수행자’로 손꼽히는 분들인데, 나 또한 그런 스님들의 법을 들으며 가까이서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은 가늠이 어려웠다.
어디 그뿐인가. 한중일 3대 대표 선사들이 함께했던 1990년대 말의 대규모 법석에서 간화선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던 스님은 지금 내가 20여 년째 사보를 맡고 있는 봉화 문수산의 어른 스님 금곡 무여 스님이시다. 또한 『화엄경』 등 대표 경전을 연찬하신 대강백 여천 무비 스님의 일을 다년간 맡아오고 있으며 잠깐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햇수로 25년째 맡고 있는 영축총림의 포교지 업무 역시 내게는 살갗과도 같은 ‘나의 일’로 자리한 지 오래이다.
그런가 하면, 지혜와 자비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경봉 스님은 내가 미처 뵙지 못한 어른 스님으로 스님의 시봉이신 명정 스님과의 오랜 인연은 책으로, 전시로 대중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소중한 기록이기도 했다.
그즈음, 내겐 동향 출신의 스님 한 분이 늘 가까이 계셨다. 결혼식의 주례를 서주셨던 스님은 시대를 대표하는 행정승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닐 정도로 세속의 공부가 높았고 칭찬에 후한 어른이셨다. 오래지 않은 어느 날, “깎은 모습으로 다시 오고 싶다”는 말씀을 남기고 떠난 스님이셨기에 당시의 슬픔은 스무 날, 서른 날이 지나야 밥을 제대로 먹을 정도였다. 벌써 이달 말이면 스님의 열네 번째 기일이다. 분에 넘치는 칭찬과 격려를 주셨던 스님이셨기에 다하지 못한 감사의 인사를 언제쯤 만나 드릴 수 있을지….
많은 스님들과 여럿의 도량,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과 함께한 시간이 셀 수 없는 숫자를 쌓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지탱하게 해주는 힘은 역시 부동의 그분,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처님처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자비의 수행자 선응 지현 스님, 언제나 한결같으며 올곧은 강백 수진 스님 등 미혹한 중생의 외호를 맡아주고 계신 선지식들이 계셔 내 삶은 더욱 윤택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어언 30여 년 전, 나를 불교 안으로 끌어주신 스님과 20여 년 전, 영축총림의 중책을 맡아 문서 포교를 맡게 해주신 스님들과 사부대중께 머리 숙여 삼배의 예를 올린다.
그럴 것이다. 일찍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란 부처님의 품 안에서 글로, 음성으로 아낌없는 포교를 하는 최상급의 부루나존자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 길을 난 오늘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
김윤희 | 1995년 부산불교신문사를 시작으로 불교언론사에 입문한 후, 1999년 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를 창간했고 2000년 동명의 출판사를 설립했다. 현재는 부대사업으로 경전어록 전문 강설 도량 ‘부산열린 불교 아카데미’도 개설해 운영 중이다.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