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중표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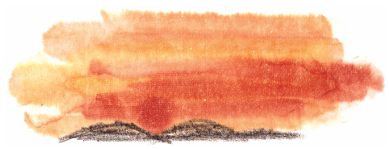
‘있다(有)’는 판단과 ‘없다(無)’는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눈으로 보아서, 보이면 ‘있다’고 판단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판단한다. 유무판단(有無判斷)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지각활동이다. 우리는 지각활동을 통해 보는 자(眼)와 보이는 대상(色)이 ‘있다’고 판단한다. 중생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이 두 가지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잡아함경』 「306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두 법(二法)이 있다. 그 둘은 어떤 것들인가? 眼과 色이 그 둘이다. (…) 眼과 色을 연하여 眼識이 발생한다. 이들 셋이 화합하는 것이 觸이다. 촉에서 受, 想, 思가 함께 생긴다.
부처님께서 “일체(一切)는 십이입처(十二入處)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존재가 지각활동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있다’는 것은 지각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의 ‘있음’이다. 따라서 지각활동이 없으면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무엇이 외부에 실재하고, 그 실재하는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때문에 보이고, 그 보이는 것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고락(苦樂)의 감정도 생긴다.
‘일체는 십이입처’라는 말은 이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십이입처의 ‘있음’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있음’은 무엇인가? 십이입처의 ‘있음’, 다시 말해서 보는 자(眼)와 보이는 것(色)의 ‘있음’이 모든 ‘있음’의 근거라면, 십이입처는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는 실체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眼(cakṣu)은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감각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활동을 의미한다.
‘있음’은 명사로 표현되지만, 본질은 동사적이다. 예를 들어 “비가 내린다”라는 말을 살펴보자. 이 말은 ‘비라는 존재가 떨어져 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명사로 표현되는 비라는 존재는 내린다는 일을 하기 이전에 그 일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지각해 ‘비’라고 명명(命名)함으로써 ‘비’는 ‘존재/있음’이 되는 것이다. 만약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현상에 ‘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명사로 표현되는 ‘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비’의 ‘있음’은 이렇게, 어떤 사물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사건[물방울이 떨어지는 사건]에 우리가 붙인 이름/명사에 기인한다. 따라서 명사로 표현되는 ‘비’의 본성은 ‘떨어져 내리는 일’, 즉 동사적이며, 명사는 우리가 조작한 개념일 뿐이다. 우리는 비라는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일을 볼 뿐이다.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은 비라는 존재가 아니라 물방울이 떨어져 내리는 일이다.
주어인 ‘비’는 술어인 동사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어와 동사로 표현되는 우리의 언어적 표현은 주어와 술어를 개별적인 존재와 현상으로 분리시킨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적 관습에 젖어 비판 없이 언어를 사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관습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과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분명히 다르다. 이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명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명사를 사용하되, 그 명사에 동사적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는, 주어와 술어가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붓다는 ‘있음/존재’를 표현할 때 ‘bhāva(有)’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dhamma(sk. dharma;法)’라는 개념을 사용한다.1) 범어 ‘dharma’는 ‘지탱하다, 유지하다(to uphold)’는 의미의 동사 어근 ‘dhṛ’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붓다는 왜 ‘있다(to be)’는 의미의 동사 어근 ‘bhū’에서 파생된 ‘있음’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개념인 ‘bhāva(有)’나 ‘atthitā(有)’를 사용하지 않고 ‘dharma(法)’를 사용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있다”는 판단은, 외부의 존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십이입처에서 연기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따라서 인식과 무관하게 실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bhāva(有)’나 ‘atthitā(有)’는 “있다”는 판단의 대상에 대한 적절한 지칭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왜 ‘dharma’를 사용했을까? ‘dharma’는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현상을 일으키고 유지시키는 법칙을 의미한다. 조건에 의지해 연기하는 존재들은 이러한 법칙이 실현된 것이다. 따라서 ‘dharma’라는 단어는 실체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유지되는 과정 그 자체, 즉 사물들이 작용하는 방식을 나타낸다. 이 세상이 유지되고, 모든 사물이 유지되는 것은 질서정연한 과정을 통해서이다. 예를 들어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면 연소하면서 불이 나타나며, 그 과정이 계속되면 불이 타는 현상은 유지된다. 이렇게 어떤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때 우리는 그것의 ‘있음’을 지각한다. 모든 ‘있음’은 이렇게 질서정연한 과정이 유지되고 있는 동사적 현상이다. 붓다는 ‘있음’이 나타나고 유지되는 질서정연한 과정을 ‘연기(緣起)’라고 불렀으며, 연기한 것을 ‘dharma(法)’라고 불렀다. 따라서 ‘dharma(法)’는 문법적으로는 명사이지만 의미는 동사적이다. 이러한 ‘dharma(法)’의 동사적 구조를 표현한 개념이 ‘공(空;suñña)’이다. 『잡아함경』의 「335경(第一義空經)」에서는 ‘공’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眼은 생길 때 오는 곳이 없고, 사라질 때 가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이 眼은 부실하게 생기며, 생기면 남음 없이 사라지나니, 업보(業報)는 있으나 작자(作者)는 없다. (眼生時無有來處 滅時無有去處 如是眼不實而生 生已盡滅 有業報而無作者)
이 경에서는 중생들의 ‘있음’의 근거가 되는 안(眼)에 대해 그 실상이 공(空)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사물을 보면서, ‘보는 자[眼]’와 ‘보이는 것[色]’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보는 자’는 어디에 있는가? 보는 자는 볼 때는 분명히 눈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런데 보지 않을 때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경에서는 보는 자(眼)에 대해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보는 자는 보는 행위의 작자(作者)가 아니라 보는 행위의 결과, 즉 업보(業報)라는 것이다.
우리는 몸속에 있는 마음이 눈이나 귀를 통해서 외부의 공간 속에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는 대상, 즉 형색(色)이나 소리(聲)를 보거나 듣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다. 『잡아함경』 「294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무명(無明)에 가리고 애욕에 묶여서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안에는 분별하는 마음(識)이 있고, 밖에는 이름과 형태를 지닌 대상(名色)이 있다’라고 분별한다. (愚癡無聞凡夫無明覆 愛緣繫得此識身 內有此識身 外有名色)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마음, 즉 식(識)으로 이름과 형태를 지닌 대상<名色>이 외부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어리석은 상태에서 갈망하는 마음에 묶여서 일으킨 망상(妄想)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상을 분별해 인식하는 마음, 즉 식(識)은 무엇인가? 『맛지마 니까야』 38. Mahātaṇhāsaṅkhaya-sutta(갈망하는 마음의 소멸 큰 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조건(緣)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그것에 의하여 그것으로 명칭을 붙인다오. 시각활동(眼)과 형색(色)들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시각의식(眼識;cakkhuviññāṇa)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청각활동(耳)과 소리들(聲)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청각의식(耳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후각활동(鼻)과 냄새들(香)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후각의식(鼻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미각활동(舌)과 맛들(味)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미각의식(舌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촉각활동(身)과 촉감들(觸)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촉각의식(身識)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마음(意)과 법(法)들에 의지하여 분별하는 마음(識)이 생기면 의식(意識)이라는 명칭을 붙인다오.
대상을 분별해 인식하는 마음은 지각활동을 통해서 연기(緣起)한 것이지, 몸속에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지각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업보(業報)에 대한 명칭일 뿐, 외부의 대상을 인식하는 작자(作者)가 아니라는 말씀이다. 중국 선종의 3조 승찬(僧瓚) 선사는 『신심명(信心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밖에 있는 인연을 좇지도 말고
안에 있는 허망한 것 속에 머물지도 말라
안과 밖이 하나가 되어 평안한 마음을 지니면
밖의 인연과 안의 망상이 저절로 사라지리라
(莫逐有緣 勿住空忍 一種平懷 泯然自盡)
보이는 대상(對象)은 보는 주관(主觀)으로 말미암아 보이고
보는 주관(主觀)은 보이는 대상(對象)으로 말미암아 보나니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관을 알고 싶다면
원래 이들이 하나이며 공(空)임을 알라
(境由能境 能由境能 欲知兩段 原是一空)
밖에 있는 인연이란 이름과 형태, 즉 명색(名色)으로 분별되는 대상이고, 안에 있는 허망한 것은 대상을 분별하는 식(識)이다. 주관과 객관은 삶을 통해 연기한 것이므로 본래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망상을 일으켜서 주관과 객관을 분별하지 말고,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는 공(空)의 도리에 따라 자타(自他)의 분별없이 살라는 것이 부처님과 조사(祖師)들의 한결같은 말씀이다.
이중표│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는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동 대학 호남불교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아함의 중도체계』, 『근본불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이 있으며, 『불교와 일반시스템 이론』, 『불교와 양자역학』, 『맛지마니까야』 등의 번역서가 있다.




0 댓글